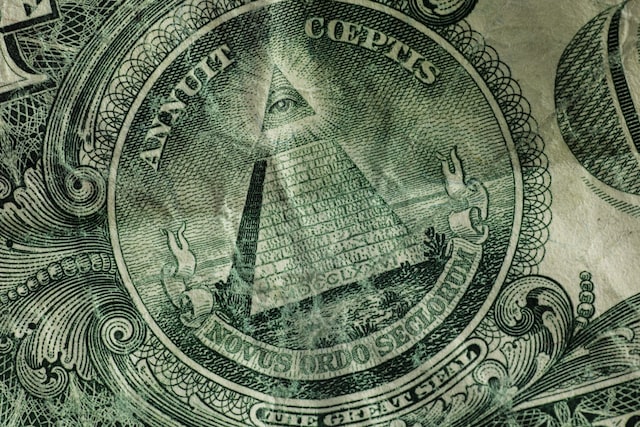-
목차
반응형
‘아가씨’에 숨겨진 권력의 이중성
영화 ‘아가씨’는 2016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작품으로, 사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스미스’를 원작으로 각색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연진으로는 김민희, 김태리, 하정우, 조진웅이 주연을 맡았으며, 러닝타임은 약 145분입니다. 화려한 미장센과 치밀한 심리 묘사로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도 주목받았으며, 국내외 관객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의 표면에는 ‘사기극’이라는 장르적 외피가 씌워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이라는 주제가 여러 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권력의 양면성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삼촌(조진웅)이 히데코(김민희)를 억압하는 구도처럼 보이지만, 그 억압은 단지 남성성의 폭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히데코 역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수키(김태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수키는 또다시 자신의 계급적 우위를 이용해 주인에게 접근합니다.
이 영화 속 인물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고, 지배당하면서도 지배하려 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 복잡한 심리적 권력 관계를, 기묘할 만큼 아름답고 잔혹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권력의 흐름이 단순히 계급이나 성별로만 구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조차도 때로는 권력의 형태로 작용합니다. 수키와 히데코 사이에 피어나는 감정은 처음에는 기만과 이용의 산물이었지만, 점차 순수한 사랑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 또한 서로를 통제하려는 미세한 권력의 균열을 품고 있음을 영화는 은근히 암시합니다. ‘아가씨’는 그렇게 권력이라는 주제를,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닌 복합적인 인간 본성의 문제로 승화시킵니다.‘아가씨’의 서사 구조가 전하는 메시지
‘아가씨’의 가장 혁신적인 미덕 중 하나는 그 서사 구조에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직선적 플롯을 따르지 않고,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점과 진실을 펼쳐 보입니다. 이러한 서사적 장치는 관객이 매번 자신의 판단을 새롭게 수정하도록 유도합니다.
1부에서는 수키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는 그녀의 음모와 감정에 몰입하며 히데코를 불쌍한 아가씨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2부에 들어서면, 시점은 히데코로 전환되고, 수키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히데코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삼촌의 학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기를 이어온 복합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 둘이 힘을 합쳐 억압의 세계를 탈출하는 여정을 그립니다.
이 서사 구조는 관객에게 단순히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에 따라 진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를 통해 ‘진실이란 항상 다층적이며, 시선에 따라 변한다’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영화 전체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게 만드는 힘을 지닙니다. 1부에서 보았던 대사 하나, 몸짓 하나가 2부와 3부를 거치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다가오는 경험은, 관객에게 영화적 쾌감뿐 아니라 깊은 성찰을 선사합니다.
결국 ‘아가씨’는 단지 플롯의 전복을 위해 3부 구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와 권력, 사랑, 자유의 의미를 서사 그 자체로 새롭게 체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장치를 완성해낸 것입니다.‘아가씨’ 결말에 숨은 또 다른 해석
‘아가씨’의 결말은 언뜻 보면 명확합니다. 수키와 히데코는 삼촌과 백작의 지배를 벗어나 함께 도망치고,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 결말에도 여러 해석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들의 자유가 완전한 해방이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삼촌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도망쳐간 세상 역시 여성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은 아닙니다. 사회적 억압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은밀하고 숨어야 하는 운명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영화는 이들의 도피를 해피엔딩으로 그리면서도, 동시에 그 끝이 새로운 투쟁의 시작일 수 있음을 조용히 암시합니다.
또한,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보여주는 교감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억압을 견뎌냈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으며, 결국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이 결말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존재의 해방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해방조차도 결코 영원하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간순간 새롭게 다져야 하는 것이며, 자유는 끝없는 긴장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영화는 짙은 여운 속에 남깁니다. 결국 ‘아가씨’의 결말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선택하고, 함께 세상을 견디는 이야기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영화를 본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영화를 시청한 관객에게 여운처럼 피어오르게 됩니다.반응형'영화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넷플릭스 드라마 ‘악연’ 리뷰 : 끊을 수 없는 운명의 고리 (0) 2025.04.18 하정우 출연 영화 ‘브로큰’ 리뷰 - 복수 너머에 남은 것 (0) 2025.04.17 영화 ‘화이트 버드’ 리뷰 : 전쟁의 폐허 속 날아오른 희망의 날개 (0) 2025.04.17 넷플릭스 드라마 ’선의의 경쟁‘ 결말, 등장인물, 줄거리 (0) 2025.04.17 영화 ‘퓨리‘ 2차 세계 대전 실화 같은 전쟁 영화 정보, 줄거리, 리뷰 (0) 2025.04.16
부자되는 연결고리
N잡하는 아빠의 블로그 입니다. 비즈니스 문의 : oursummerinc@gmail.com